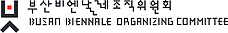Busan Biennale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와 1987년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미술제인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의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1998년에 통합되어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로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전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산비엔날레는 정치적인 논리 혹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미술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술인들이 보여 주었던 부산문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과 실험성 등은 오늘날까지도 부산비엔날레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미술전, 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의 3가지 행사가 합쳐진 경우는 부산비엔날레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는 국내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확장시킴과 동시에 글로벌한 문화적 소통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동으로부터 39년째에 접어든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대중화, 즉 일상 속의 예술 실현을 목표로 하여 실험적인 현대미술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생긴 일 (김준 ✕ 김사강 ✕ 김창일)
2022. 2. 25(금) 17:00
- 바다는 부산의 삶의 기반이자 도시로서의 변화를 일군 자연적 조건이다. 거대한 항구와 항구로 유입된 물자가 기반이 된 산업 외에도 부산과 그 주변에는 어촌과 어촌을 둘러싼 노동,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태계가 존재한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해조류로부터, 바다 위에서의 이주노동 그리고 항만 건설에 이어 공항 건설을 앞둔 길목의 섬 가덕도 이야기까지 바다를 둘러싼 일, 노동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 발표 1: 바다와 인간, 공존의 함수 ‘바다풀’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 그 긴 역사에 비하면 바다농사를 시작한 것은 찰나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가 바다에 머무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중심이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다. 여기에 굴, 바지락 등 조개류까지 더하면 갯밭의 씨줄날줄의 살림살이 ‘갯살림’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영도 ‘동삼동패총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 하구갯벌은 최고의 조개밭이었고, 김 양식장이었고, 감태서식지였다. 명지동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소금밭이 있었다. 모두 갯벌이 있어 가능했다. 지금도 명지김과 기장미역은 부산 해조류의 명성을 잇고 있다. 해조류를 통해 바다와 인간의 공존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어촌생활을 30여년간 이어오며 어민을 만나고 어촌을 다닐수록 막연하게 뭍의 대안이 바다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확신이 생겨나고 있다. 자본의 논리가 지속가능한 지구의 대안이 아니지만 공동체만 좇는 것도 현실과 떨어져 있다. 그 실마리를 갯살림과 섬살이에서 찾고 있다. 『바닷마을 인문학』이 그간의 생각을 묶은 것이다. 그 여정에 『바다맛기행』(전3권), 『섬:살이』, 『섬문화답사기』 (전8권 중 5권 출간), 『물고기가 왜?』, 『어떤 소금을 먹을까』, 『김준의 갯벌이야기』라는 책이 도움을 주었다. 지금도 갯벌과 바다, 섬과 어촌을 찾고 그 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일하며, 슬로피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간 『바다인문학』 출간 준비 중이다.
- 발표 2: 남항에서 만난 선원 이주노동자 이야기 부산의 명물 자갈치 시장 뒤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이 들어오는 남항이 있다. 남항을 떠난 어선들은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몇 달씩 고등어, 삼치, 조기, 갈치, 오징어를 쫓으며 바다를 누빈다. 그 바다에서 매일 같이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 올려 어창에 쌓는 이들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다. 한국인들은 점점 꺼리는 바다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남항도, 자갈치도, 우리 밥상의 물고기도 없어질지 모른다.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과 그에 도전하는 이주민들을 다룬 논문으로 201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부산에 있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이주민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 발표 3: 부산 해양문화의 길목, 가덕 수로 가덕 수로는 대구, 숭어, 전어 등 회유성 어종의 길목이자 군사 요충지이며, 이제는 부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섬이다. 가덕도 앞 바다는 회유성 물고기, 컨테이너선박, 군함과 잠수함이 오가는 길목이고, 거가대교와 가덕대교를 통해서 육상교통의 큰 축이 형성됐다. 신공항까지 건설된다면 육로, 해로, 하늘 길이 가덕도에 모이게 된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체감하며 살아가는 가덕도 어민들의 삶을 기록했다.
-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민속박물관에 근무하며 최근 10년 간 연평도, 강화도, 남해도, 삼척, 울산, 영도, 가덕도, 제주도 등에 장기간 거주하며 한국 해양문화를 조사했다. 『물고기의 길목, 가덕도의 해양문화』(2021), 『영도에서 본 부산의 해양문화』, 『강화의 포구』, 『조기의 섬에서 꽃게의 섬으로-연평도』 등 해양민속지 19권을 썼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동해안 어촌의 돌미역 채취방식와 소득분배 방식 비교」, 「한국 어촌의 그물 활용양상」 등 10여 편이 있다. 요즘은 제주해녀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육지해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