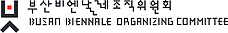Busan Biennale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와 1987년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미술제인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의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1998년에 통합되어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로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전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산비엔날레는 정치적인 논리 혹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미술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술인들이 보여 주었던 부산문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과 실험성 등은 오늘날까지도 부산비엔날레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미술전, 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의 3가지 행사가 합쳐진 경우는 부산비엔날레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는 국내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확장시킴과 동시에 글로벌한 문화적 소통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동으로부터 39년째에 접어든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대중화, 즉 일상 속의 예술 실현을 목표로 하여 실험적인 현대미술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고공투쟁 (김정근)
조회 666
관리자 2022-12-15 15:15
영화감독

2011년 1월 6일 새벽,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 올랐다. 그 무렵 공장에는 400명 해고 통보가 임박했다는 말이 무성했다. 사측은 지난 1년간 3,000여 명을 잘라 내고도 더 자를 심산이었다. 오랜 단식으로 상한 몸을 회복할 여유가 없었다. 35미터 높이, 1평 남짓 크레인 조종실에 짐을 부렸다. 수년간 땅에서 복직 투쟁을 하던 이가 하늘로 올라 해고 반대 투쟁을 하는 체공인이 되었다. 그가 남긴 쪽지에는 언제 내려오리라는 기약이 없었다.
2003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도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같은 자리에 올랐다. “죽음이 투쟁의 수단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참여정부 대변인의 날선 발언과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이 이어지던 129일째. 김주익은 크레인 난간에 목을 매었다. 그와 막역했던 조합원 곽재규도 50미터 독(dock) 아래로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이 숨지자 회사는 그제서야 정리 해고를 철회했다. 김진숙에게 129일은 ‘어떤 목표’였다. 20년 지기가 스스로 목을 맨 곳에 오른 그에게 지난 8년은 허깨비 같은 시간이었다. 그 미안함을 털어내기 위해 하늘에 스스로를 고립시켰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 지독한 역사의 반복이 다시금 비극이 될까 그가 매달린 허공을 바라보며 마음을 졸였다. 외려 김진숙은 크레인 생활을 오감이 열리는 경험이라 표현했다. 1평 남짓 공간에 앉아 140자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이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울고 웃는 시간이었다. 그의 고공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의 버스’가 조직되었다. 5차례, 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버스에 올랐다. 회장님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 가는 망신을 당하고서야 정리 해고는 ‘휴직’으로 바뀌었고 309일 긴 고공농성은 끝을 맺었다. 11월 10일, 마침내 체공인은 땅을 밟았다. 아찔한 땅 멀미에도 꼿꼿하게 선 그가 던진 첫마디는 “주익 씨도 이렇게 걸어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였다. 이윽고 85호 크레인은 해체되었다. 회사가 무속인에게 날짜를 받아 해치웠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순간 해체된 건 한진중공업의 경영진이 아니었을까. 훗날 조남호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하고 HJ중공업으로 사명마저 바뀌었다.
’한진중공업 고공투쟁’은 방만한 기업 경영에 대해 각성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는 ‘희망의 버스’라는 새로운 운동을 탄생시켰다. 반면 309일이라는 긴 시간을 공중에 매달려야, 1만이 가까운 이들이 모여야만 오만한 재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오늘도 전설처럼 첨탑에, 망루에, 옥상에, 굴뚝에 올라 체공인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