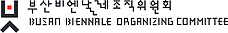2011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조회 1,553
관리자 2013-03-25 12:57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불확실하고 낯선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모래사장에 세워진 이 거대한 물고기는 원래 속해 있던 자연 환경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져 있다. 이 물고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재구성하려 한다. 6미터 높이의 이 생물은 콘크리트 환경에 자신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 하나의 구조물로 변신한다. 우리가 창조하는 빌딩과 건축물들을 연상시키는 차갑고 황량한 외관으로 자신을 감싼 것이다. 사회는 풍요의 힘과 권세의 의미로 건축물을 창조하며, 이는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는 지위와 위신을 상징한다. 빌딩은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불운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거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 국가에 원조와 지원금을 보내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들로 규정된다. 빌딩과 기념물은 국가들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가장 복잡한 디자인으로 건설된 가장 높은 빌딩들. 안타깝게도 이것이 세계에서 우리를 규정하는 창조물이다.
따라서 이 생물은 이러한 체계 안에서 나머지 다른 기념물들과 경쟁하고 공존하기 위해 애쓴다. 다른 기념물과 주변의 건축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융합시키고, 앞서 만들어진 건축물들과 경쟁하면서 스스로의 형체를 만들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황새치는 싱가포르 말레이 민담 '싱가푸라 딜랑가 토닥'과 관련 있다. 또한 한때 일제의 지배 하에서 마쓰시마와 유사한 휴양지로 만들어졌던 송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한 데 묶은 본 작품의 황새치 디자인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융합을 시도하는 한편, 송도에서 개최되는 바다미술제의 해양성을 더욱 강화한다. 바다와 도시 가운데에 전략적으로 세워진 본 작품은 자연 환경과 인공적이며 피상적인 것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이상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