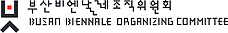아카이브

Busan Biennale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와 1987년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미술제인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의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1998년에 통합되어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로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전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산비엔날레는 정치적인 논리 혹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미술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술인들이 보여 주었던 부산문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과 실험성 등은 오늘날까지도 부산비엔날레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미술전, 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의 3가지 행사가 합쳐진 경우는 부산비엔날레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는 국내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확장시킴과 동시에 글로벌한 문화적 소통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동으로부터 39년째에 접어든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대중화, 즉 일상 속의 예술 실현을 목표로 하여 실험적인 현대미술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천
조회 473
2024부산비엔날레 2024-12-03 13:55
<견보탑품: 통도사 영산전 벽화 모사>, 2012, 한지에 채색, 157x162cm, 469x230cm, 157x162cm.
<진리의 눈>, 2024, 벽에 아크릴 물감, 50x100cm.
<관음과 마리아-진리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2024, 한지에 견본채색, 지본채색, 800x281cm (2).
종교적 관점의 행복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과 같다. 이러한 진리 찾기로서의 행복은 종교에서 일컫는 ‘광명’ 또는 ‘빛’과 상통하는 의미를 지닌다. 관세음보살과 성모 마리아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써 역사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상징화된 ‘성화’다. 송천은 <관음과 마리아-진리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2024)에서 이 성화를 ‘진리’로 해석했다. 그에게 있어 진리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고 있으며,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또는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존재다. 촛불 같기도 물방울 같기도 한 ‘주형광배(舟形光背)’는 생명, 지혜, 사랑, 평화와 같은 자애의 가치를 포괄한다. 관세음보살의 화려함과 성모 마리아의 간결함은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지만 하나의 경외심을 보여준다. 표방하는 교리와 사상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고귀한 삶에 이르는 목적은 같다. 관세음보살 그림에는 유연하고 보존성이 탁월한 전통한지의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 위에 중첩된 채법을 사용했다. 성모 마리아 그림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불교회화의 기법을 접목하여 천연안료와 비단을 사용했다. 도상은 이탈리아 무라노의 산타 마리아 도나토 대성당에 있는 12세기 모자이크 오란스의 작품에 표현된 복식을 참고하여 창작했지만, 13세기 고려 시대 불화와 비슷한 시기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관음과 마리아-진리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옆에 그려진 <진리의 눈>(2024)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의 시선을 통한 애민사상의 표현이다. 송천은 생명과 공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두 이미지를 한자리에 모아 인간성의 회복,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염원한다.
<견보탑품: 통도사 영산전 벽화 모사>(2012)는 이미지의 재현과 복제가 가지는 전복적 의미를 찾는 이번 전시의 주요 주제와 적극적으로 상통한다. 보물 제1826호 ‘영산전’과 보물 제1711호 ‘영산전 벽화’로 각각 지정된 ‘통도사 영산전’은 고대 인도의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설법하던 모임인 영산회상(靈山會上)의 내용을 재현한 건물이다. 그림의 내용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11품 「견보탑품(見寶塔品)」으로, 이를 한국에서 그린 것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과 중요한 의의를 지닌 18세기 초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통도사 영산전은 임진왜란 이후 1714년에 중건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형식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 하로전 구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이다. 내부에는 다보탑(多寶塔) 벽화를 비롯하여, 동서남북 벽면에 48장면의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源流應化事蹟)’ 내용이 그려져 있다. 이 가운데 26장면은 석가모니불의 행적과 관련된 그림이고, 22장면은 전법 제자들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다. 송천은 벽 중앙에 그려진 다보탑 벽화를 전통한지 위에 천연안료와 분채를 사용해 현상 모사했다. 석가모니불이 인도 영축산에서 설법할 때 다보여래(多寶如來)의 탑이 땅에서 솟아나 설법을 찬탄하니 그 탑 안으로 들어가 같이 앉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석가모니불의 설법이 모두 진실임을 다보여래(多寶如來)가 증명하고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좌우에 그려져 있는 협시청중도(脇侍聽衆圖)는 제자와 신중(神衆)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송천은 영산전 건축의 벽면 구조로 인해 나뉘어 배치된 형태까지 그대로 모사했다. 이러한 사찰 벽화들은 조선 후기에 많이 그려졌는데, 당시 승원의 수행 환경과 포교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옛사람들이 그림으로 남긴 공동체의 삶과 수행 과정은 해방 공간의 한 형태를 상상하게 한다.
송천